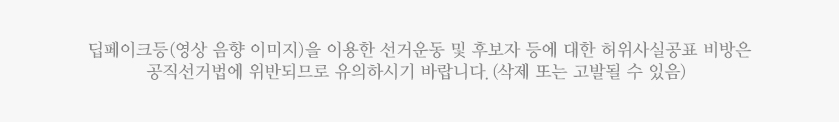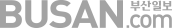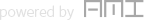[2030 칼럼] 불통과 불타는 소통 사이
- 가
정소희 공모 칼럼니스트
솔직·대담해진 요즘 세대
평등 지향 사회 분위기에
소통의 욕구 더 강렬해져
존중받는다는 인식 줄 때
구성원들의 신뢰 얻게 돼
국정 운영에 꼭 명심해야

올봄 연예계 소식에는 인상적인 소통의 장면들이 있었다. 하나는 스캔들로 점화된 배우 한소희의 SNS 소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기자회견이었다. 한소희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 남자 연예인을 두고 전 여친과 현 여친인 두 여자 연예인이 다투는 것처럼 비쳐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오래 사귄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에 ‘환승연애’라는 의심이 씌워졌고 무고한 죄목에 억울했던 현 여친 한소희는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불타는 소통을 보여줬다.
매우 솔직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까지 한 소통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녀의 소통은 아마도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이유는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거나 광고 재계약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녀가 가장 바랐을 일인 새로운 연인과의 사랑을 지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자 편에 서고 싶어 한다. 당연하게도 대중은 세 배우와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고 그들의 삼각관계가 어떤 복잡성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에는 커플이 된 두 사람보다는 혼자 남겨진 전 여자친구가 가장 지켜주고 싶은 약자로 보였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 여친인 배우 혜리의 입장에 훨씬 더 이입되고 공감하였다. 이미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배우 한소희의 소통은 충분한 진심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대중에게 반감을 일으켰다.
때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 아주 초반에는 이 스캔들의 전개를 가늠할 수 없었다.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지에 따라 대중의 시선의 방향을 돌리거나 혹은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때를 기다려 해명을 시도하거나 혹은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파트너가 이번 일로 전 연애감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말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매력으로 어필해 온 그녀의 스타일에서 고무적인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다. 과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소속사를 통해서만 대응했던 사례들과 달리 최근에는 스타가 스스로 입장문을 올리고 직접 댓글을 적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가 더욱 소통 지향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방증처럼 보인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저 세상의 고고한 연예인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연예인을 원하는 것 같다. 스타들에게 작품활동만큼이나 팬들과의 관계 맺기와 SNS 채널 관리가 중요해진 이유기도 하다. 예컨대 마케팅에서도 연예인이 대중에게 인지도는 높을지라도 오히려 관여도와 충성도는 친밀하게 소통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쪽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적극적인 소통의 성공적인 최근 사례가 있다면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개저씨’와 ‘지X’, ‘씨X’ 등 비속어가 필터 없이 등장한 사상 초유의 욕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불타는 소통법으로 직장 내 성차별과 갑질 문제들을 거침없이 제기했다. 동시에 솔직하게 공개한 상황 설명과 억울한 감정들에서 ‘진정성’을 느낀 2030세대 직장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며 밈과 이모티콘으로 회자되어 ‘개저씨 신드롬’을 만들었다. 또한 거대 기업과 엘리트 기득권에 맞서는 개인의 울분으로도 비쳐 약자 편에 서고 싶은 대중의 도덕심에도 호소되었다.
오늘날 소통은 매우 중요해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를 떠나는 이유로 ‘소통이 안 돼서’를 1위로 꼽았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듣기론, 젊은 사내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불만이 고조될 때는 회사의 어떤 소식을 내부 채널로 전달받기 이전에 언론 기사를 통해 먼저 접할 때라고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떠나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언질을 주는 것만으로도 ‘소통하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런 소통의 감각들은 불통의 아이콘이 되고 싶지 않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어 국정 과정과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게 아닐 수 있다. 열린 태도와 솔직한 대화, 경청하려는 노력, 겸손하고 낮은 자세, 존중받는다는 느낌 등 충분히 실천 가능한 것들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설령 지켜주고 싶은 약자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굳이 강자처럼 보이려고 더 노력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