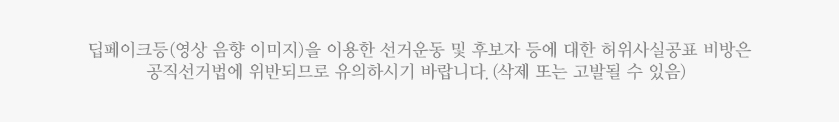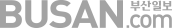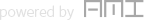가족 대신했던 ‘사회적 끈’, 생애 끝까지 잇는다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 가
1인 가구 늘며 무연고 사망 급증
친구·지인 장례주관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자체 공영장례로 치러
본보·동구, 장례 사전등록 시도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김새빛(36·가명) 씨는 숨을 거둔 지 반나절 만에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30년 지기와 약혼자가 있었지만, 가족관계 서류상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의 장례는 지자체가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무연고자 유골은 부산영락공원 지하에 5년간 봉안 후 산골 처리가 원칙이다. 친구와 약혼자는 장례를 직접 치러주고, 별도로 봉안해 추모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 씨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기까지 가족이 아닌 이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1인 가구와 비혼 증가, 저출생 등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연고자(가족) 중심의 장례·추모 제도와 문화가 고착화돼 있어, 지인과 이웃 등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무연사회의 확장 속에 존엄한 죽음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의 해답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3603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415명으로 2년 새 50% 이상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가 거부된 사망자를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70% 이상이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가 거부된 경우이며, 취약 계층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계층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무연사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곁의 죽음’임을 뜻한다.
김경일 부산시 인권위원장은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친구나 이웃, 생활공동체를 함께한 동료는 있다”며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건 평생 고독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연고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어 온 친구나 이웃, 지인 등이 장례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은 유명무실하다. 비혈연 장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부재한 탓이다.
정부는 무연고자가 유언장, 자필서명서 등의 방법으로 지인, 친구 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거나 알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산 지역 무연고 사망자 619명 중 사회적 가족이 장례 주관자로 지정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부산일보〉는 한 달여간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무연고자와 무연고 사망자들의 지인을 만났다.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과 괴리된 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 분석했다.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 동구청과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시도한다.
※〈부산일보〉는 무연고 사망자의 쓸쓸한 사후를 경험했거나, 무연고 사망 처리를 원치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온라인 전용 콘텐츠로 연재합니다. 부산닷컴과 모바일에서 온라인 전용 ‘연결 : 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기획 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성 기자 [email protected] , 손혜림 기자 [email protected]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