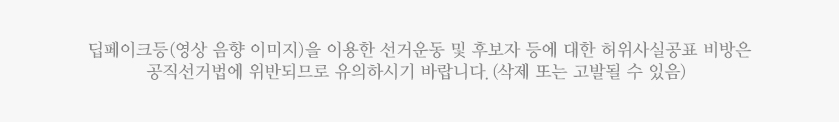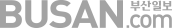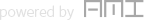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꼭 보고 싶은 작품 중 하나가 ‘바튼 아카데미’였습니다. 영화에 빠삭한 대학 선배가 ‘강추’한 영화였는데, 국내 개봉 확률이 비교적 낮은 다른 작품 상영 시각과 겹쳐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지난 21일 ‘바튼 아카데미’가 개봉했습니다. 시네필과 아카데미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기대작을 관람한 후기를 남깁니다.
 영화 ‘바튼 아카데미’.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영화 ‘바튼 아카데미’.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바튼 아카데미’는 1970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크리스마스 방학 동안 학교에 남게 된 ‘루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언뜻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시놉시스이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을 지닌 작품입니다.
자세한 설정은 이렇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사립 고등학교 ‘바튼 아카데미’의 학생과 교사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2주간 방학을 즐깁니다. 대부분은 학교를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은 당직 교사와 함께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학교에 남게 된 이들은 ‘꼰대’ 교사와 ‘꼴통’ 학생, 그리고 늘 우울한 주방장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세 사람이 열흘 넘게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사 교사로 일하는 ‘폴 허넘’(폴 지아마티)은 전통적 교육방식을 고집합니다. 완고하고 엄격한 그는 학생들은 물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왕눈깔’이라는 멸칭으로 통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러나 폴은 올곧은 신념을 가진 참교사입니다. 좋은 품성의 젊은이를 배출하는 것이 그의 인생 최우선 목표입니다. 학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유력 정치인의 자녀라 해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낙제점을 줍니다.
이런 폴은 교장 입장에선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교장의 호소에도 불구, 폴은 학생들의 성적을 엄격하게 매기고 방학 시작 당일에도 수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나마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 ‘앵거스 털리’(도미닉 세사)는 머리는 좋지만 말을 함부로 해 수시로 마찰을 빚는 문제아입니다. 방학을 기다렸던 앵거스는 집안 사정으로 학교에 남게 됐습니다. 무뚝뚝한 주방장 ‘메리 램’(더바인 조이 랜돌프)도 학교에 머무르면서 이들의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영화 ‘바튼 아카데미’.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영화 ‘바튼 아카데미’.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소소한 웃음에 감동까지…탄탄한 연기와 각본 덕
소재만 놓고 보면 흔하디 흔한 힐링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작품엔 묘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우선 각 캐릭터의 개성이 확실하고 입체적입니다. 평소에도 학교 밖으로 좀체 벗어나지 않는 외톨이 폴은 외유내강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면도 나약합니다. 젊었을 때 품은 학문의 뜻은 접었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했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폴에게 남은 건 자기합리화입니다. 폴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잘 나가는 동창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앵거스는 수려한 외모와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이지만 성격에 하자가 있습니다. 툭하면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내뱉어 동급생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의 본성은 착해 보입니다. 영화엔 타지 생활에 힘들어하는 한국인 학생도 등장하는데, 폴은 이 친구를 따뜻하게 대합니다. 순수한 구석이 있는 앵거스가 엇나가게 된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주방장 메리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메리는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을 늘 그리워하며 때때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지는 중년 여성입니다. 메리의 아들은 장래가 촉망받는 이 학교 학생이었기에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원치 않게 동고동락하게 된 이들은 처음엔 삐걱거립니다. 특히 폴과 앵거스는 도무지 친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폴은 융통성이라곤 없는 원칙주의자에다 학교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은둔형 인간인데 반해, 앵거스는 자유분방하고 혈기왕성한 말썽쟁이 10대 학생입니다. 게다가 폴은 부모를 잘 만나 호의호식하는 앵거스 같은 학생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상처를 살펴보게 된 이들은 서로를 보듬어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줄거리만 놓고 보면 ‘코믹’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지만 알렉산더 페인 감독은 유쾌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이들을 한 데 모아 놓고도 재치 있는 대사와 시트콤을 보는 듯한 상황 연출로 자연스러운 웃음을 자아냅니다. 객석 곳곳에서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배우들의 열연도 한몫했습니다. 알렉산더 페인의 대표작인 ‘사이드웨이’(2005)에서 호흡을 맞췄던 폴 지아마티의 연기가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 줍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중년 여성을 연기한 랜돌프, 입체적인 캐릭터인 앵거스를 맡은 세사의 연기도 훌륭합니다. 세사는 영화를 촬영한 학교의 졸업반 학생인데, 이번 작품 오디션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영화 ‘바튼 아카데미’.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영화 ‘바튼 아카데미’. 유니버설 픽쳐스 제공
‘죽은 시인의 사회’ 떠오르는 엔딩…아카데미도 주목
영화는 결말부에선 잔잔한 감동을 안깁니다. ‘닭장의 홰 같이 지저분한’ 삶이라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마무리입니다. 주인공인 폴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1989)가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관람평을 찾아보니 기자처럼 느낀 관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개봉 시기가 아쉽다는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잔잔한 전개와 인간관계에 대한 메시지, 크리스마스 전후라는 시간적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연말에 잘 어울립니다. 레트로풍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 등 미장센을 통해 1970년대의 분위기를 잘 재현했고, 영상 채도를 낮춰 그 시절 영화 질감까지 살려 냈습니다. 정겨운 기타 소리가 돋보이는 배경음악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영화를 연출한 알렉산더 페인은 믿고 볼 수 있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 ‘어바웃 슈미트’(2002)와 ‘사이드웨이’로 각본상을 수상했고, ‘디센던트’(2011)로 작품상도 받았습니다.
‘바튼 아카데미’ 역시 지난달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지아마티)과 여우조연상(랜돌프)을 받았습니다. 또 내달 열리는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남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에 더해 작품상과 각본상, 편집상 등 다섯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습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